사회혁명으로 승화시킨 철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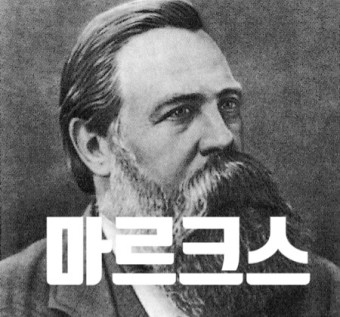
1. 마르크스의 생애
사회혁명으로 승화시킨 철학자인 마르크스는 1818년 라인 강 근처 트리어의 부유한 유대인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1835년 17살에 본 대학에 입학을 하여 엄청난 독서와 수많은 시를 지어 문학적인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대학시절에 사고뭉치로 철장신세까지 지자 부친이 명문 베를린 대학에 전학을 시켰으며, 그는 이 시기부터 헤겔 사상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철학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헤겔 좌파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만의 사회 철학을 발전시켰으며, 1841년 예나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이 있는 프랑스 파리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그는 프랑스에서 평생 동지로서 자산가인 엥겔스를 만나 학문에 몰두하였으며, 그가 죽은 후에는 엥겔스는 그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1848년 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자 큰 희망을 가지고 독일에 귀국했으나, 혁명이 실패하게 되자 독일에서 추방되어 영국으로 활동무대를 옮기었다.
그는 영국에서 가난한 삶의 와중에서 도서관에 파묻혀 그 유명한 “자본론”을 저술하여 완성 하였으며, 1883년 폐암으로 사망을 하자 엥겔스가 자본론 2권과 3권을 미완성 원고를 정리하여 출판을 하였다.
2. 인간의 소외
마르크스의 철학은 인간 소외의 양상을 분석하면서 출발하였으며, 이는 헤겔의 철학에서 유래했으며, 헤겔에 의하면 절대정신이 소외된다면 자연이 되므로 정신이 먼저이고 물질적인 자연은 그다음 이라고 한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헤겔의 소외 개념을 거꾸로 뒤집어서, 세계의 본질은 물질로서의 자연이지 정신이 아니며, 자연으로서의 물질이 먼저이고 정신은 나중에 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헤겔 철학의 관념과 추상성은 마르크스에 의하여 구체성과 실천성으로 바뀐 것이며, 그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크게 4가지 소외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경제적 차원의 소외로서, 인간은 자기가 만든 생산품으로부터 소외 되어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의 노동보다도 물건인 도자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도 하나의 상품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소외로서, 국가는 부르주아를 위한 위원회에 불과 하며, 철저히 지배 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국가는 계급 대립을 심화시키므로 소멸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셋째, 종교적 차원에서의 소외는 종교는 현실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환상을 주입시키고 잘못된 사회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종교는 인간의 소외를 지속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다.
끝으로 철학에 의한 소외는 사변적이고 관념론적인 철학은 종교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므로 이런 철학은 세속화된 신학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3. 생산력과 생산의 관계
인간의 경제적 생산 활동은 하부구조이고, 이 생산 활동을 해석하고 조직하는 이념 체계인 정치, 철학, 종교, 예술 등은 상부구조이므로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의 부산물이라고 했다.
역사발전의 결정요인은 생산관계이며, 이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형성하며, 이 경제적 구조 위에 법적 정치적 상부구조가 구축되어 이에 상응하는 사회의식이 생겨난다고 하였으며, 인간의 의식이 인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인간의 생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으며,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있어서는 첫째, 물질적 측면에서 생산은 사람들이 자연을 개발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활동이라고 했으며, 이는 어떤 생산 조직, 도구들의 소유 등이 포함되는 것이 생산력의 차원이라고 했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 하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 협동해야 하며, 여기에는 생산과정의 통재 및 생산물의 분배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가 포함되는 것이 생산관계의 차원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적 생산관계를 영주와 농노 혹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착취 관계에 관심을 집중 했으며, 경제적 토대인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했을 때 사회는 변화한다고 했다.
그는 한 사회에서 생산력이 발전해 나가는데 기존의 생산관계가 걸림돌이 될 때는 사회적 혁명의 분위기가 무르익는다고 했다.
결국, 인간사회는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로, 다시 봉건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 모든 발전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했다.
자본주의 시대 이후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에 대하여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시대에서도 생산력과 생산 관계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유물론적 역사관의 종점은 공산주의 사회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소수인 부르주아 계급이 다수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착취하는 계급 구도가 철폐될 것이며, 만인의 실제적인 경제적 평등이 성취된다고 했다.
이러한 혁명적인 결과는 어느 한 나라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국제적으로 성취되어야 하며, 모든 나라가 해방되어야 하기에 영구혁명이자 세계혁명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