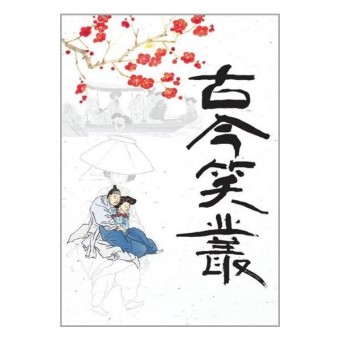
고금소총(古今笑叢)에 관하여!
고금소총이란, 인간에 전래하는 문헌 소화를 집대성한 설화집으로서, 편자 및 편찬 연대는 미상이나 19세기 조선 후기로 추종되고 있다.
이 속에 수록된 소화집의 편저자는 대체로 알려져 있으며, 모두 789편의 소화가 수록되어 있다.
소화로서의 특징은 한문소화로서 일반적인 소화와 구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인 소화는 구전하여 전래되는 구비전승이다.
여기서 수록된 소화는 이미 몇 백 년 전에 문헌으로 정착되어 전하고 한문으로 기록되었으며, 수집, 편찬한 작자들이 대개가 한학자로서의 문장가요, 관료나 양반들이라는 특성이 있다.
소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분, 성격, 주제, 구성 등은 일반 구비 소화와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한문 소화는 학자나 양반 등의 특정인에 의하여 수집, 편찬되었기 때문에 편찬자의 창의와 윤필이 가미되어 있어 순수한 구비 전승 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문 소화의 주인공은 바보나 꾀쟁이 재담꾼 등 국한되지 않고 위로는 왕후장상, 학자, 관료, 양반, 중인, 무당, 판수, 승려, 기생, 노비 등 빈부와 남녀노소가 다 웃음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또한, 남녀의 육담인 외설 담이 그 양이나 질에서 우세하고 과감할 정도로 노골적인 것이 특징이다.
지나친 외설 담이라 할지라도 교훈의 냄새를 풍기며 각 소화의 끝에 건전한 평까지 부연하여 도덕성을 강조하였다.
고금소총을 분류하면, 외설적인 것은, 다시 단순한 웃음을 유발하는 것과 슬기와 재담이 곁들여진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화에 나타난 해학을 정리하면, 아무리 익살스런 사람이라도 혼자서 연출이 불가능하므로 두 사람 관계에서도 매개체가 필요로 하였다.
외설 담은 비윤리적이고 범법적인 과감한 행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았으며, 예를 들면, 객사의 유부녀를 범하는 것이나 수절 과부를 꾀어내는 행위 등이다.
어떤 특수사회의 습속이나 관념으로 그들만이 가지는 언어, 습관과 불가분의 상관성이 있었다.
예를 들면, 양반과 기생, 여종과의 관계, 노복과 여주인과의 관계 등이다.
표현기교에서 한국적인 혜학을 체험할 n 있는 것은, 언어를 지닌 민족적 특징으로서 언어구사의 묘에서 웃음이 유발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소화는 한글로 표현된 것과 한문 표현의 두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이야기도 한글 표현으로 웃음이 나와도 한문 표현으로 무미건조하거나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골적인 외설 담에서도 표현의 문자인 한문 표현에서는 해학을 느껴도 한글로 표현하면 웃음보다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